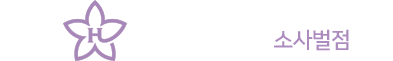[12
관련링크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작성일25-04-28 07:46본문
[123RF]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체중조절을 위해 인공감미료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역효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섭취 후 식욕이 증가하거나, 식욕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타볼리즘(Nature Metabolism)이 다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케크 의대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실험자를 ▷수크랄로스 음료 ▷물 ▷설탕물을 마신 그룹으로 나눠 뇌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수크랄로스 섭취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식욕이 17% 증가했다. 특히 비만한 사람들의 배고픔 정도가 가장 컸다.주목할 점은, 인공감미료 수크랄로스 섭취가 설탕보다 식욕을 더 올렸다는 것이다.연구를 이끈 케이티 페이지 박사는 “인공감미료가 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뇌가 단맛을 느끼면 열량을 기대하는데, 열량을 얻지 못하면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 배고픔을 느끼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인공감미료를 장기간 섭취하면 보상·동기 부여·의사 결정 등에 관여하는 뇌 영역에 영향을 미쳐 평소 식습관에서도 음식이나 단맛을 더욱 갈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페이지 박사는 “모든 사람이 인공감미료의 반응을 똑같이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이나 비만, 특히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는 이들은 식욕 조절 기능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경계했다. 수크랄로스와 설탕(sucrose) 음료, 물 섭취 후 뇌의 변화 [네이처 메타볼리즘 논문 캡처] 당뇨 환자의 인공감미료 섭취 문제는 이전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왔다.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교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실험생물학(Experimental Biology, 2018)에 실린 논문에서 “인공 감미료는 설탕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화·흡수되면서 당뇨, 비만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관련 위험성을 경고했다. 2023년 WHO는 인공감미료의 장기 섭취가 2형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영양 전문가들도 다이어트 시 인공감미료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 작품이 영화관의 큰 화면에서 나오길 바라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 영화 시장이 너무 죽어서, 힘든 환경이라는 건 알아요."영화 출연만 고수하다 최근 글로벌 OTT 플랫폼 시리즈 작품에 출연했던 한 배우의 말이다.영화관입장관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올해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17'로 전국 296만6917명이었다. 한국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건 '히트맨2'로 254만7448명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파묘', '범죄도시4' 등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힘들다는 관측이다. 코로나19로 개봉이 연기됐던 일명 '창고 영화'도 소진돼 가는 상황인 만큼 영화 사업 붕괴 자체를 우려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영화관 총관객 수는 1억2313만 명, 매출액은 1조1945억 원으로 팬데믹 이전(2017~2019년) 대비 각각 55.7%, 65.3% 수준에 그쳤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3월 영화산업 결산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극장 전체 관객 수는 643만7886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 1169만7143명보다 45% 적은 525만9257명이었다. 매출도 약 620억원으로, 46.8%에 해당하는 약 546억원이나 감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화 산업이 죽을 쑤는 동안 넷플릭스를 통해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실을 목격한 배우, 제작진은 글로벌 OTT로 몰려가고 있다. 영화만 고집하던 유명 배우들이 OTT 시리즈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된 이유다.배우도, 인력도 떠나면서 양질의 이야기 공급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CJ EN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5대 투자배급사로 불리는 이들은 코로나19 이전엔 매년 40편 이상의 영화를 공급해왔다. 하지만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