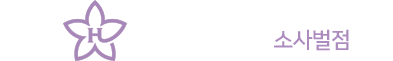’를 보면 당시 주된 방침은화전지는
관련링크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25-04-14 00:48본문
화전정리사’를 보면 당시 주된 방침은화전지는 용제림이나 뽕나무를 심어 산지를 복구한다는 게 골자였다.
강원도의 1차화전정리사업(1965년~1968년)의 시작이다.
당시 강원도의 계획은 8436㏊를 신규 개간해 화전민들의 대토로 제공하고화전농가 6702호를 이주.
강원도의화전정리가 처음부터 성공을 거둔 건 아니었다.
1970년대의 성과 이전에 1960년대의 실패가 있었다.
전쟁 이후 황폐화 된 국토를 재건하기 위해 강원도는화전정리10개년 계획을 세웠으나 ‘원대한 꿈’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 적지 않은 화전민이 다시.
되어 복지조림 법인을 설립하고 277명의 조합원을 구성해 출자해서 200㏊에 잣나무와 낙엽송을 심어 경제림을 조성한 기록들이 이번 유네스코 등재에 결정적인 기록물로 인정받았다.
강원도는 이렇게화전정리와 산림녹화를 통해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림면적.
며 “50년이 지났지만 그 말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복지조림사업은 강원도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한 독자적인 사업으로,화전정리사업과 함께 지난해 ‘산림녹화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의 통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1, 2차 대단위화전정리사업과 타 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원도청 복지조림에 관한 기록물은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소가치가 높은 기록물.
1974년 2차화전정리사업 당시 작성된 춘성군 이전화전민관리대장 속보= 유네스코가 최근 우리나라 산림녹화의 역사를 담은 ‘산림녹화 기록물’에 대한 권고를 결정(본지 3월 24일 1면)하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등재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강원도.
산림청이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산림녹화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사방공사와화전정리, 조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산사태, 가뭄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황폐화된 국토를 회복시켜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덕분에 다른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원도청 복지 조림, 1, 2차 대단위화전정리, 요접법에 관한 사료 등 희소가치가 높은 기록물들을 발굴, 등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원도민들도 산림녹화 기록물의 유네스코.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사회적 가치, 희소성, 역사성’ 등이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1, 2차 대단위화전정리사업과 타 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원도청 복지조림에 관한 기록물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희소가치가 높은 기록물이다.
논의 예정인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를 찾았다.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 주민들이 “1976년 3월 산림청의화전정리사업으로 적절한 이주보상 대책 없이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성덕면 개미마을 공동묘지 일원으로 강제 이주당해 척박한 상황에서.